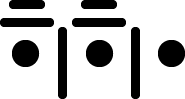
그 소녀
<
안초롱: 그리고 이건 《모텔전》 리뷰를 보고 생각한 건데요. 허호 작가가 재훈 씨의 사진을 보며 ‘야노(야외 노출)’이라는 장르를 언급하셨잖아요. 전시에서 보이는 사진과 시각적으로 유사한, 야노 사진들은 온라인 공간 중에서도 음지에만 떠도는 이미지들인데, 재훈 씨의 작업이 그 이미지를 전시장이라는 공간으로 불러와 물질로 남기는 일이기도 하잖아요. 이런 관점으로 보는 것도 재밌었어요. 어떻게 보면 야노 사진은 온라인에서 해시태그로만 꿰어져 있고 물질로 남길 일은 없는 이미지니까요.
그리고 야노나 CD(크로스 드레스)라는 장르 자체가 이성애자 남자들이 많이 하는 페티시 아닌가요? 여장이란 행위 자체로 성적 쾌감을 느끼는 사람들에는 이성애자가 많다고 해요. 왜냐하면 결국 여장은 남성만 할 수 있는 거니까. 여자가 남장하는 드랙킹Drag King이랑 완전히 다른 개념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작가는 실제로 그런 취미를 갖고 있을 거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있으면 뭐 어때요?
재훈: 그쵸. 있다는 걸 인정하고 알아보기 시작해야 한다고는 느껴요. 제 작업 행위와 결과물이 기존에 존재하는 어떤 사태와 유사하다면, 그에 관한 문화는 제가 맞닥뜨리고 넘어야 할 큰 허들이겠죠.
안초롱: 재훈 씨 작업에서는 상징성이 두드러지는 요소잖아요. 자기가 다루는 재료와 연관된 문화이니 ‘이런 게 있구나’하고 알아보는 것도 좋을 거예요.
아. 그리고 여장을 하는데, 그 변신의 대상인 여자를 10대나 20대 언저리의 젊은 소녀로 지정했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가발을 쓰고 힘이 없는 채로 걸려 있는 이 여자가 30대는 아니잖아요. 어린 여자죠. 특히나 <오래된 방은 궁전>에서는 완전히 소녀처럼 연기하신 것 같던데요? 수줍은 모드랄까? (웃음) 어떻게 보면 “안 돼 안 돼 안 돼”라고 말하는 수동적인 여성의 이미지에 가깝죠. 앞서 말한 강간 판타지랑도 이어질 수 있겠고요.
재훈: 사진 속 인물들이 10대, 20대 여자라고 인지하셨을 때 어떠셨어요? ‘그냥 그렇구나’라고 받아들이셨나요?
안초롱: 그냥 궁금했죠. 어린 여성이 힘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M 성향을 보이는 10대 20대 여자에 대한 판타지도 많이 그려지고요. 그런 걸 보여주고 싶었나?
어쨌든 이미지로서 그려지는 여자는 젊은 여자가 절대다수잖아요. 나이 든 여자는 이미지로서의 가치가 없고요. <수염 드로잉>의 외딴 여자도 가슴이 되게 크고 그래서, 에스트로겐이 빵빵하게 나오는 여성의 이미지를 상상하면서 작업하신 것으로 보였어요.
재훈: 저는 제 작품들을 보면서 ‘이 정도면 여자 아니냐?’는 생각도 하지만, 스스로가 남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일이 중요해요. 이 점이 (아까 말씀하신) 어설픈 화장이나 게으른 제모의 배경 같고요.
그랬을 때 이 작업 행위의 목표는 ‘진짜 여자 되기’보다 그냥 여자 되기라는 ‘행위’를 하기에 가깝거든요. 이게 저와 ‘여자’라는 외부 사이의 경계를 앞뒤로 흔드는 행동이기도 한데요. 대화 시작하기 전에 초롱 씨가 ‘저는 당사자가 아니면 말을 아끼는 편’이라고 했잖아요. 그 말에 비춰봤을 때 제 작업 행위는 당사자가 아닌데도 마구마구 말하는 일에 가깝다고 느껴지거든요. ‘당사자성’이라는 단어 자체가 a와 b 사이의 벽을 굉장히 의식하게 하는 효과를 일으키기도 해서, 이 경계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했어요.
안초롱: 이중적인 마음이긴 한데요. 저는 이상하게 진실을 막 따지게 돼요. 내가 진실하지 못한 사람이라 그런지. (웃음) 그래서 아까 직접적으로 물어봤잖아요, 평소에 여장하고 야외 노출을 직접 하시는지. 제 상상으로는, 그런 취미를 오랫동안 트위터에 올리다가 ‘이거 한번 전시해 볼까?’ 하는 식으로 만들어진 전시인가 싶었거든요. 근데 아니라고 하셨죠.
그렇다면 재훈 씨는 야외라는 무대에서 누군가가 되기를 연기하신 건데, 그 행위의 의미는 뭘까? 왜 나는 이 ‘여자-되기’를 하고 싶은 걸까? 왜 <대기 시간>에 보이는 모습이 나 같다고 느껴질까? 그런 생각을 계속하다 보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요?
재훈: 엄청 단순한 이유인데요. 제가 실제로 위치한 그룹들의 구성원이 거의 다 여자인데, 그와 동시에 포르노를 보는 유년기의 습관이 계속돼서에요. 한쪽에는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로 대중화된 모델인) 남성과 대등한 주체로서의 여성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숨 쉬듯 성폭력 당하는 사물로서의 여성이 있는 거죠. 두 환경 사이에서 페미니즘과 퀴어에 관해 공부하는 저는 어느 쪽에도 온전히 속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둘 중 누구에게도 온전히 동화될 수 없고요. 그런 이질감과 소외감이 작업의 출발점이에요.
안초롱: 오히려 저는 그게 더 재미있는 것 같은데요? 주변에 있는 여자들에게 공감하고 싶은데 잘 안되고, 그 이질감으로부터 시작했다고 하니 그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장도 그딴 식으로 하는구나... (웃음) 동기가 그렇다면 여장을 완벽하게 할 필요 없잖아요. 대충 머리 기르고 치마 입으면 여자니까.
재훈: 맞아요. 근데 관객이 작업만을 보면서는 ‘이 작가가 원래 야외 노출을 일상적으로 하는데 그걸 전시의 문법으로 풀어낸 거구나’라고 이해한다는 점이 저한테는 유의미한 감상이었어요.
그리고 어제 리뷰에서 강간 판타지를 인정하고 생각을 해봤는데, 이 작업이 상상적인 트랜지션이라고 했을 때 패티시나 판타지도 작업 과정을 통해서 발견되는 것 같더라고요.
안초롱: 맞아요. 근데 너무 어려워. 나는 섹슈얼리티가 진짜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저 이제 나이도 거의 마흔인데 아직도 잘 모르겠어. 나도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아마 영원히 찾다가 죽지 않을까 싶어요. 더구나 한국은 굉장히 보수적이고 남성성이나 여성성 모두 굉장히 억압된 사회잖아요. 사회적 규범 자체가 그러니까 더 더 못 찾다가 죽는 거고, 그리고 찾는 일 자체를 두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하는 손가락질을 받기도 하니까요.
재훈: 주어진 범위 바깥을 탐구하는 일이 권장되는 사회가 아니긴 하죠. 어떤 담론이 촉발되면 그 안에서 주되지 않은 입장에 관해서는 발화되지 않고요. 수치심, 죄책감, 질투 같은 감정을 느끼기에 더없이 좋은 땅 위에 서 있다고 느껴요. 많은 사람들이.
크레딧
2024.07.31
섹슈얼리티 (조심선희, 『여/성이론 14』, 2006)
루인
2016
3. <수염 드로잉>과 <오래된 방은 궁전>
안초롱, 재훈
2024.07.31
Pleasure Points
Alastair Philip Wiper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