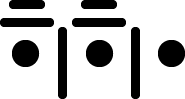
《Summerspace》는 여성성에 관한 전시가 아니에요. 그러나,
<
재훈님, 안녕하세요.
보내주신 글 잘 읽어 보았어요. 작가님들의 작품과 전시를 세심하게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시장에 가장 오래 머물렀던 제가 느끼고 보지 못했던 것들이 다른 이의 시선으로 단번에 포착될 때, 그 생경함에 대해 겸손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 깨달음은 전시를 기획할 때 항상 마음속에 담아두고 싶은 사실이에요.
저는 재훈님께 드리는 답장을 통해, 말미에 다뤄주신 ‘여성성’에 관해 이야기해 보고 싶어요.
《Summerspace》는 여성성에 ‘관한’ 전시는 분명 아니에요. 기획의 글에서 표현했듯, 본 전시의 주제어는 ‘잠재성’입니다. 저는 특정한 이미지나 이야기로 명확하게 전달되는 전시가 아니라, 실타래처럼 엉켜 어디가 시작인지 끝인지 알 수 없는, 완결되지 않을 것만 같은 심상이 펼쳐지는 전시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견고한 형태와 이미지를 경계하는 작품들, 의미의 비결정성, 그로부터 비롯되는 감각적인 불안. 전시가 주제어로 삼은 ‘잠재성’과도 다름없겠지요.
그러나 단언할 수 있는 것은, 《Summerspace》는 여성주의적 태도로 만들어진 전시라는 사실이에요. 전시는 포용을 일종의 질료로 삼고 있습니다. 프랑스 철학자 미셸 세르가 말한 것처럼, “나에게 의존하고 있는 것에 나 또한 의존하고 있다”는 우리의 존재론적 특성, 불완전하기에 상호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이와 같은 믿음을 지닌 기획자가 꾸린 전시가 획득하게 된 유연함, 배려, 친밀성, 다정함 그리고 “부드러운 의지"1와 같은 가치는 제가 신뢰하는 여성주의적 태도에요.2
그래서 각 작업은 적극적으로 서로에게 침범, 의존, 개입하고 있어요. 나하님의 붓 자국이 보마님의 제스처로 연결되고, 유자님의 액자 위 보마님의 태그가 놓여요. 또 일정한 리듬처럼 위치한 유자님 작업들 사이에 보마님 작업이 위치함으로써 그 흐름이 흐려지고요. 혜경님의 나레이션에 보마님의 사운드가 의도치 않게 배경음처럼 자꾸만 들려요. 한편 보마님은 평면 작업들이 모두 자리 잡은 이후에 작품을 설치하기 시작하셨는데, 그로 인해 발생한 공간적 제약을 받아들이며 설치 작품을 완성하셨지요.
전시를 설명하는 저의 글에서도 각 작가에 대한 소개 글 사이에 또 다른 작가님에 관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읽으셨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전시의 그래픽 디자인을 맡아준 마카다미아 오님이 표현한, 햇볕을 마주하곤 또렷이 응시하는 인물이, 전시를 위해 쓰인 리윤님의 시 「우리의 여기의 이것의」에 등장하는 ‘유리’를 지칭하는 것 같다는 혼동을 주어요. 이처럼 서로 다른 물질의 언어들은 느슨하게 뒤섞여 여름공간의 사위를 만듭니다.



혹은 박보마에게 기틀이 되어 준 김유자와 이나하의 평면 작업
형상을 불분명하게 해 여지가 개입될 수 있도록 자리를 비워 두고, 의미를 미리 단언하지 않는, 상대의 의존을 받아들이고 나 또한 유연한 태도로 상대에게 다가가는, 《Summerspace》가 취하는 방법론과 미적 감수성은, 특정한 사조와 유행하는 담론으로 전시를 만들고 획일적이고 형식적인 태도로 전시를 양산하는 관료주의적 태도와는 다른 접근 방식이었다고 믿습니다.
순식간에 모양을 만들어 솟아오르고 일순간에 형체를 잃어버리기에 중심과 주변을 정의 하기 힘든 파도처럼, 끊임없는 흐름 자체로서 그것만의 독특한 분위기를 생성하는 전시, 가장자리를 에두르며 중심을 흐트러트리는 여성주의적 태도를 배태한 전시가 어쩌면, 우악스레 담론을 앞세우는 전시보다 미학적인 의미에서 더 정치적일 수 있지 않을까요?
선물해 주신 낸 골딘의 사진을 보고는 조금 놀랐어요. 제가 이제껏 봐왔던 낸 골딘의 작품에는 항상 아프고 상처받은 인물들이 가득했거든요. 그런데 이사진은 생생하고 구체적인 삶의 감각을 사수하는 사소한 행동들이 나를 아프게 하는 현실을 극복하게 하는 힘처럼 느껴졌어요. “아침 먹자”3라는, 지독한 악몽에 시달린 밤을 깨우는 따뜻한 말 한마디처럼요.
또 사진은 저로 하여금 버지니아 울프의 『파도』속 한 문장을 떠올리게 했어요.“나는 뿌리내려져 있다. 하지만 나는 흘러간다.” 성장하는 중에도, 쇠락해 가면서도, 이 세계는 나에게 반복적으로 처절한 생의 감각을 느끼게 한다는 것. 그러나 나는 그저 무력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오히려 구원처럼 다가오기도 합니다.4
마지막으로 제가 다음으로 기획한 전시 《꿀꺽》(상엽, 지언님과 함께 기획한 전시로, 로르 프루보, 엘리노 하이네스, 이은새 작가가 참여하며 두산갤러리에서 2024년 7월 10일부터 8월 10일까지 열립니다.)은 버지니아 울프의 『파도』 속, 다음의 문장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나는 경솔하며 너희들보다 용감해서 몸을 태우지 않고 자신의 아름다움을 빈약함으로 방해하지 않는다. 나는 아름다움을 통째로 꿀꺽 삼킨다. 그것의 소재는 육체야. 물질로 만들어졌지. 나의 상상력은 육체의 상상력”
세 명의 여성 기획자가 서로의 관심사와 기획의 방법론을 실뜨기처럼 연결하여 탄생하게 된 전시는 여성의 몸과 물질성, 육체의 상상력에 관한 이야기로 귀결되었는데요. 전시의 제목인 ‘꿀꺽'은 물질과 실체가 결부되는 소리,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드러내거나 감출 때 취하는 모양새, 남의 것을 제 것으로 탐하는 태도를 은유하는 단어를 의미합니다. 전시는 육체와 물질을 매개하며 서로를 상대의 몸속에서 만들어 내는, 시작과 끝을 구분할 수 없는 장소로서의 여성의 몸을 다룹니다. 《Summerspace》가 (재훈님께서도 말씀주셨듯) 기체의 문법을 띠었다면, 《꿀꺽》은 끈적이고 질척한 액체의 문법을 보여주리라 생각해요.
앞으로의 시대는 기체 문법과 액체 문법이 고체 문법을 대신하게 될 수 있을까요?
여름 공기의 뭉근한 기운을 담아,
승아 드림
- 김리윤, 「우리의 여기의 이것의」, 《Summerspace》를 위한 시
- 로지 브라이도티, 『변신』
- 김리윤, 「얼마나 많은 아이가 먼지 속에서 비를 찾고 있는지」, 『투명도 혼합 공간』
- 이 문장은 유자님이 전시를 준비하며 공유해주셨던 한강의 『노랑무늬 영원』을 떠올리며 썼어요. “잔멸치 떼를 만난 적 있다. 무수한 은빛의 점들이 일체 반짝이며 배 밑을 헤엄쳐 갔다. 빠른 속력으로 그것들이 사라지고 나자, 헛것을 보았던 것 같았다. 한순간의 빛, 떨림, 들이마신 숨, 물의 정적이 내 안에 남아 있다. 그게 전부다."
- 《꿀꺽》 전시 서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