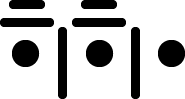
버드나무 여신
<

저는 《살도 뼈도 없는 나에게》라는 제목으로 개인전이 9월에 예정되어 있는데, 이번 전시에 인용하고 있는 언희님 시에요. 전시 제목은 같은 시의 마지막 구절이고 사진을 보면서는 앞부분이 떠올라서 공유해요.
재훈님 이번 개인전 기록을 온라인으로 받아보고 참 아름다워서, 계속 미뤄지고 있던 답신이 떠올라 잠시간 드려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 년도가 유독 상반기 하반기 각각이 모두 비슷한 시기로 발표 일정이 몰리게 되었답니다.
단체전 《혀 달린 비》 준비과정에 대해서는 공유드릴 수 있는 얘기들을 잠시 복기..
좋았던 것은 그때가 마침 Dan Lie의 설치 어시스트로 일하고 있을 때여서, 약 3주간 참여했었는데 점심시간마다 매번 반숙 계란에 데자와를 샀어요. 그러고 불 꺼진 극장에 내려가서 무대 위 작은 테이블에 앉아서 - 노트북 모니터 조명에 의지한 채로 《꽃다발은 아직》에 들어가는 펜드로잉들을 스케치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저는 선재 극장 공간을 양효실 선생님의 렉쳐 시리즈로 처음 가보게 되었었는데 그 때문인지) 마치 강단에 앉아서 홀로 렉쳐 퍼포먼스를 하는 것 같았어요. 할 말은 없지만... 아, 렉쳐가 아니라 드로잉 퍼포먼스려나요. 새카만 좌석들에서 지켜보는 시선이 느껴지는 것만 같았고, 뭔가 있었어도 굳이 방해하지 않을 것 같으니 스산한데 포근하고 참 좋았어요. 공간 자체에 그렇게 익숙해지는 게 단체전 준비에도 도움이 되기도 했고요.
(그때 들었던 양효실 선생님 강의는 이것, 이후로 학교에서 쭉 온라인 수업은 들었지만 직접 대면한 적이 없다가 모스키토라바쥬스에 섭외로 처음 뵙게 됩니다.)
제목이 기존의 이미지들이 어떻게 변형되었는지 보여주고, 형태에 있어서 여성적 기표가 추가/부각된다고 감상을 풀어주셨는데 - 제가 이미지의 형태를 의도를 들여서 변형하는 일은 되도록 지양하는 편이고, 색을 고르는 것과 가로 세로 보는 방향을 바꾸는 정도에요. (진짜 그렇게 생겼다니 별일이죠?) 스케치는 해봤자 가위날을 종이 면에 댈 때마다 다르게 빗겨나가게 되어서 할 수 없으니, 가위가 이끄는 대로 해보는 거고. 큰 재단 가위를 쓰는데 때문에 꽤 큼직큼직한 게슈탈트가 정해지고. 그게 연상시키는 게 생겨버리면 제목은 나중에 붙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23년도 작업들은 제목이 진짜 순식간에 붙었어요. 언제였냐면 OCI 개인전에 신작을 만들었다가 전시를 열지 못하고 철수할 때 - 업체 및 직원들이 포장을 해주는 상황에서 포장된 커버에 뭐라도 표시를 해야하니까 마카펜 달라고 해서 '꽃다발을 든 아이', '개가 된 여자' 이런 말을 적어놨어요. 그냥 오리고 보니 그렇게 생겼었으니까요. 그러다가 (재훈님과 제가 만나게 된) 단체전 《모텔전》에 출품하면서 그게 각각의 소제목으로 정리된 덕에 《혀 달린 비》에도 그대로 올라갔고, 지금 준비하는 신작들 - 24년의 닥종이 작업들은 약간은 더 의식해서, 또 나름대로 제목을 정해보고 있죠. 부르고 외우기 편한 이름이어야한다는 것은 좀 의식하는 부분이에요.
차학경을 생각하면서 가장 먼저 고른 건 '엉덩이 커튼'이에요. 우연히 극장에 커튼이 있고 그 색과 비슷하기도 했구요. 그 외에는 23년도 초에 작업했던 시리즈 중에서 《혀 달린 비》의 기획에 맞춰서 푸른색을 위주로 가져오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아이는 하늘색, 여자는 주로 파란색이나 남색을 선택했더라구요. 그리고 원래 그림쟁이들은 자기가 그리는 인물들이 본인과 괜히 닮게 되잖아요. (만화가들이 특정한 표정을 그릴 때 똑같이 얼굴을 일그러뜨리고서 그리게 된다던가...) 원본 사진이 책자에 워낙 작게 실려있고 해상도가 높은 편이 아니어서, 또 성별을 알 수 없을 정도로 뭉그러져 있는 몸들도 꽤 있어서, 상상해야하는 공백들이 있을 때 제 스스로의 몸에서 기인한 감각들이 좀 반영되는 것도 같습니다. '떼몸'이라고 또 표현해주신 그 몸들을 자르고 있으면 딱 그 부위가 저도 간질거리고 따끔거리고 저릿해지고 그러게 되거든요. 이런 걸 '거울 촉각' 이라고도 하더군요.
'세빗 딜도'는 원래 가로로 눕혀있던 이미지를 세워서 그린 건데, 알 모양으로 된 부분을 착용하면 밖으로 실리콘 페니스가 늘어지는 - 레즈비언 딜도 같다고 생각해서 붙인 이름인데 자기 스스로에게 하는 자위로 보여진다면 걍 이런, 싶고 아쉬운 부분이죠. 이게 구름 보고 고양이 같다, 강아지 같다, 자동차 같다, 비둘기 같다, 이러는 건데, 제가 보는 사람의 보편적인 경험과 인식의 범주를 미처 생각을 못한 듯 해요. 다시 오릴 기회가 된다면 알 형태의 딜도 뿌리도 넣어서 그려봐야 할까봐요? 무튼 축제 얘네는 아주 대단한 애들인 게, 자기들은 몸도 없으면서 저를 잘 돌봐주거든요. 깁을 참 잘 줘요 저한테? 관객들에게도 그럴 거예요.
'네거티브 면'이라며 축제를 확대해서 촬영한 이미지들은 보고 이렇게 봐줘서 고맙고 신기하다고 생각했어요. 저 잘린 면들을 보고 누군가는 섬뜩하다고 말하고, 누군가는 다정하다고 말하시더라구요. 옆면이 밀착되지 않은 거는 시행 착오가 있었는데, 완전 초기 작업은 전통방식 비슷하게 배접해보겠다고 풀을 발라봤다가 꽤 몇장을 망쳤어요. 납작하고 우글우글해진 채로 어디 넣어놨어요. 무튼 그래서 지금은 좀 웃기지만 그냥 딱풀로 합니다. 그래도 흰 딱풀은 아니고 보라색 딱풀인데요. 의도적으로 살짝 띄울 때도 있기는 있고 뭐 무튼. 바람이나 소리가 불어 통과할 수 있는 틈으로 봐주시니 반갑네요.
김언희 시인이 진주서점 등에서 한 토크를 몇 개 유튜브로 볼 수 있는데 독자층이 다양하던걸요. 서울 낭독회에서 처음 김언희 시인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너무 아름답고, 제대로 스스로를 체망에 걸러내면 저런 얼굴이 되는 건가? 죽지 않고 저런 얼굴로 살아갈 수 있는 건가? 궁금해지기도 했고 믿고 싶기도 했고. 미래님도 인터뷰에서 루이스 부르주아를 언급하면서 "Art is a guaranty of sanity(예술은 제정신을 보장한다)"고 인용한 걸 본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또, 김언희 시인의 시가 읽으면 읽을수록 너무 웃기고 시원하고 개운해서 읽는 거에요.
아글라야에게도 거리감이 있다는 건 신기한데요. 폴란타는 제목만 보고 샀다가 어느 날 욕조에서 가벼운 마음으로 집었는데 따뜻한 물 속에서도 온 몸이 벌벌 시리던걸요. 물론 읽다 보면 금세 탕물이 식어서 진짜 서늘해진 탓도 잇겠지만. 아글라야는 정말 술술 잘 읽히는데 그렇게 금세 읽고 나면 아차 하고 엄청 아프지 않던가요 온몸이?
그 외엔 '그녀들', '그녀들의 유산' 으로 열거하신 이름들이 저는 다 읽어보지도 못했고, 리스펙토르도 솔직히 학부 4학년 코로나 시절 자취방에 갇혀서 zoom으로 양효실 선생님의 강독을 들으면서 펑펑 울었지만 내용이 잘 기억이 안나요. 이때도 아팠던 거 같고. 저는 뭔가를 재훈님처럼 차근차근 면밀하게 뜯어보고 감상하는 시도는 (아카데미 등에서 누가 시키지 않는 이상 혹은 이거 진짜 알아야되는데 전혀 감을 못 잡겠을 때 말고는) 잘 안하고, 또 잘 모른다고 생각하고, 긴 글 읽기 자체에 최근에는 몇 년 째 난독증 수준의 증상도 있어요. 어릴 때 속독을 배워서 글 읽는 속도가 빨랐는데, 요즘은 그 속도로 눈만 돌아가고 한글이 죄다 외국어 읽는 거처럼 그렇더라구요. 아 그런데 이런 증상 속에서는 보통 글보다는 리스펙토르 글이 더 잘 읽히긴 하겠죠....
요즘은 그냥 어려운 생각을 잘 안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뭘 재거나 판단하지 않으려고 하고... 이게 무슨 말인가 싶지만요. 아, 김언희 시인은 선생님 시를 어떻게 읽어야합니까? 라고 누군가 묻는 말에, 그냥 올라타라고 답했던 거 같기도 해요.
비 맞는 여자와 우산 없는 남자
라는 죽이는 제목으로 리뷰를 보내주셨는데
저도 비 맞는 여자들 옆에 서있다보면 우산 없는 남자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비 맞는 여자들은 정말 미친놈들이죠. 왜 거기서 그러고 비를 맞고 있는 건지... 그런 풍경이 있다면 전 그냥 근처 어디 물가에서 멀리 기어나와 깨꽁 깨꽁 울어재끼는 청개구리 같은 것일 겁니다. 축제에는 여자, 남자, 개구리, 아이, 새, 벌레들 다 골고루 있으니까 이런저런 끝맛도 즐겨보세요.
못다한 얘기는 무척 많지만 구구절절 뭔가 답신을 쓰기는 썼는데 의미가 될 만한 말이 조금이라도 있을 지 걱정이 되네요. 무튼 이상하게 방금부터 메일이 자꾸 저장되지 않는다고 떨어대기 시작해서요. 여기서 마칠게요. 리뷰 감사해요.
연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