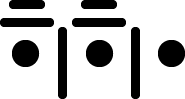
무제
<재훈, 안녕하세요. 편지를 보내게 되어 기쁩니다.
오늘 시원한 바람이 많이 불어서 밖에 나가면 기분이 좋아지는 날씨입니다. 서울은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포항 쪽은 태풍피해가 심각하다니 기분이 이상해지고 슬프네요.
제가 보고 온 전시는 공교롭게도 <오늘 본 것>입니다. 오늘 본 것에 대해 몇 자 적겠습니다.
이 전시에서 특이하다고 생각이 들었던 것은 전시 동선과 작업을 배치한 전경이었어요. 큰 사각형 영역 안에 작업들이 배치되어있고 관객은 그 주변으로 돌면서 작업을 봐야 했거든요. 그러니 한쪽 동선을 따라 가다가 반대쪽 동선에 가까이 있는 작업이 보고싶어지면 한 바퀴 크게 빙 돌아가야지만 볼 수 있었죠. 넘어서거나 가로지를 수 없는 영역이 내 앞에 있으니 울타리 너머로 작업을 지켜보는 느낌이 들어 애틋한 느낌이 들었어요.
전시장에 들어가자마자 마주친 건 <전망대>였어요. 높은 곳에서 멀리 있는 것을 관찰하는 용도인 전망대라기에 턱없이 작은 사이즈이고 아기자기한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이 조각의 이름은 전망대입니다. 저는 정서영 작가의 조각 뿐만 아니라 조각의 이름들이 너무 좋습니다. 사물이든 비사물이든 그것에 이름이 붙여지면 그 몇자가 가지고 있는 힘은 강해집니다. 정서영은 이 언어와 사물의 관계를 아주 잘 알고 또 적극적으로 사용한다고 생각해요.
이름이 가장 인상적이었던 조각으로 <1년에 한번은 치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시멘트 덩어리를 화분 삼고 있는 기다란 모조식물 2개가 서로 기대어 있는데, 하나는 서 있고 하나는 누워 있었습니다. 1년에 한 번쯤은 치워야 한다는 말에서 별거 아니지만 귀찮게 하는 일이면서 그럼에도 계속 하게되는 행동에 대한 사랑이 느껴졌어요. 아주 일상적인 개인의 경험과 사물이 맺고 있는 관계가 느껴졌어요. 이름으로서의 언어와 조각이 끊임없이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받고 있고 그들의 내밀한 관계성 속에 저도 녹아들어 따뜻하게 바라보다 왔습니다.
<뇌 속에 뼈와>가 옆에 있었는데 제가 서있는 쪽에서는 너무 멀리 있어서 앙상하고 낡은 각목이 이어붙여져 있고 한쪽은 칭칭 아무렇게나 줄이 휘감겨있으며 반대쪽에는 팽배한 줄이 천장에서 내려와 조각을 지탱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반대편에서 가까이 바라보니 나무가 아니라 브론즈와 철사였어요. 브론즈를 나무처럼 조형해놓아서 멀리서 봤을 때 낡은 각목인 줄 알았습니다. 멀리서 처음 보았을 때 형성된 이 조각의 질료에 대한 인지가 깨져버린 순간이었습니다. 조각을 바라볼 때 이 조각이 가지고 있는 질료와 형상에 대해서 우리는 직관적인 방식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빙 돌아가지 않는 이상 멀리서 봐야 했던 동선 덕분에 그러한 방식에 시간의 지연을 두고 균열이 생겼습니다.
뒤에 벽에 걸려있던 <고무줄 달린 조각>은 못 보고 지나칠 뻔했습니다. 눈높이 보다 높은 곳에 있었거든요. 손잡이처럼 고무줄이 달려있고 양동이 모양의 조각 두 개가 위아래로 포개어 쌓여있었습니다. 양동이 모양이지만 너무 눈높이가 높고 매끈한 도자기 같은 질감, 그리고 무거운 걸 담았을 때 양동이를 들 수 없을 만한 노란 고무줄 때문에 그것이 양동이는 아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고무줄을 무심코 손잡이로 사용했다가는 주욱 늘어나다가 끊어질 터입니다. 그리고 삼발이처럼 세 개의 고무줄이 달려있다는 것도 이건 양동이로서 기능하지 못 할거다는 생각이 들게끔 했습니다. 자세히 보니 두 개의 조각의 넓이와 형태가 미세하게 다릅니다.
.png)
.png)
옆에 있는 조각은 <조각적 신부> 입니다. 스펀지와 천이 원형 틀에 붙여져 있고, 그 원형 틀은 세 개의 다리로 지탱하고 있습니다. 스펀지는 그리 두껍지 않은 면이지만 구겨서 쫌맸을 때 구조가 생겨서 한쪽을 바라보면 면이지만 반대쪽을 보면 구조적인 형태로 보였습니다. 하나의 재료로 두 가지 상태를 만들어내고 그 대비되는 상태를 고정한 것 같습니다. 스펀지 위에 비슷한 색감의 천이 달려있는데, 천은 스펀지보다 훨씬 얇디 얇은 면이지만 천을 완전히 둥그렇게 말아서 걸어놓았습니다. 그러니 스펀지보다 오히려 두꺼운 구조체로 보였습니다. 기존의 재료가 가지고 있는 상태를 교차시켜, 조각적 상태를 만듭니다. 그때에 재료 그 자체로 있을 때의 관계와 다른 새로운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png)
.png)
좋은 순간이라는 제목은 봉투와 사진을 더 보도록 만들었지만 난 그 옆에 가판을 뚫고 서있는 의자와 조각이 더 눈이 갔습니다. 가판과 똑같은 색으로 칠해서 기성제품의 색을 온전히 덮어버린 의자와 그 위에 오히려 이 의자의 원래 색이었을 것 같은 조각들이 서있습니다. 쌓여있다기보다 위로 올라갈수록 하나하나 서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눈에 띄었던 점은 의자는 가판 위에 올려져 있지 않다는 것이었어요. 이것도 나와 같은 땅에 서있습니다. 어디까지가 중심이 되는 조각이고 어디까지가 주변부가 되는 가대인지 그 경계가 유동적입니다. 색에 중점을 두고 보았을 때 가대와 의자까지 한 덩어리로 보이고, 이 의자를 사물 그 자체로 보면 가대와 의자의 조합으로 보였습니다. 어떤 것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계속해서 중심과 주변부의 경계가 흔들리게 됩니다.
.png)
<텐트 하나쯤은 칠 줄 알아야지>에서는 <뇌 속에 뼈와>와 유사한 조형적 언어가 읽혔습니다. 칭칭 감겨 늘어뜨려져 있는 모습과 팽배한 상태의 긴장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상태가 끊임없이 서로 저울질 하다가 적절한 타이밍을 찾은 그 시점을 고정하여 조각적 형태로 유지해놓았습니다.
2020년 바라캇 컨템포러리에서 <공기를 두드려서> 정서영 작가의 전시를 보았던 적이 있는데요. 그때 정서영 작가의 전시를 보고 나왔을 때, 서론 본론 결론이 아주 정교하고 세밀하게 짜여진 "아주 잘 쓰인 글" 한 편을 읽고 나온 느낌이었어요.
2022년 서울 시립미술관에서 본 <오늘 본 것>은 그때와는 다르게 정갈한 작가의 메모장을 한 장 한 장 살펴본 느낌이 들었네요.
오늘이 좋아질 수 있다는 가능성
재훈
2022.10.19